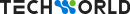트랜지스터의 구조와 역할, 그리고 트랜지스터가 바꾼 전자산업의 모습
[테크월드=이건한 기자] 전자산업의 과거이자 현재, 나아가 미래의 변화를 책임질 반도체 핵심 소자 트랜지스터(Transistor). 혹자는 트랜지스터를 ‘전자공학의 꽃’이라 부르기도 한다.

현대 트랜지스터의 표본, MOSFET
시간이 흐르며 트랜지스터의 구조는 보다 효율적인 방향으로 진화했다. 초기 접촉식 트랜지스터의 뒤를 이어 현재까지도 가장 널리 사용되는 형태는 1960년에 개발된 ‘금속 산화막 반도체 전계효과 트랜지스터(MOS Field-Effect Transistor, MOSFET), 일명 ‘모스펫’이다. 모스펫은 쇼클리의 트랜지스터보다 소형화 측면에서 유리하고 생산비도 저렴하다. 또한 지금의 반도체를 상징하는 실리콘을 주요 소재로 사용한 것도 이 모스펫이다. 특히 대규모 집적회로 구현에 유리한 모스펫의 대중화는 반도체 업계에 대대적인 집적도 심화 경쟁을 일으키게 된다.
여기서 잠시 흥미로운 이야기를 짚고 가자면, 모스펫의 주요 개발자가 바로 ‘강대원(姜大元)’이란 한국인 물리학자란 사실이다. 강 박사는 2000년 집적회로(IC) 개발 공로로 노벨상을 받은 잭 킬비(Jack Kilby)가 수상식 현장에서 “강 박사의 모스펫 기술이 오늘날 반도체 산업의 발전을 이끌었다.”고 치하했을 만큼, 반도체 역사에서 큰 족적을 남긴 인물이다. 그런데도 반도체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에서, 강대원 박사는 그가 남긴 업적에 비해 잘 알려져 있지 않아 아쉬운 인물 중 하나다.
 |
| [그림6] 집적회로(IC) |
작게, 더 많이! 집적도 무한 경쟁
트랜지스터가 진공관을 대체한 이후 업계의 화두는 이제 하나의 회로 안에 트랜지스터를 얼마나 '더 작게 더 많이’ 심을 수 있는가로 초점이 맞춰졌다. 보통 전자제품은 고성능이면서 크기가 작을수록 높은 가치를 인정받는다. 이를 위해선 연산을 담당하는 내부 마이크로칩부터 소형화될 필요가 있는데, 초소형 마이크로칩이 제대로 된 성능을 발휘하려면 작고 미세한 트랜지스터를 집적회로 안에 최대한 촘촘하게 박아 넣어야 한다. 그리고 이점은 곧 반도체 제조 업체 간의 집적도 향상을 위한 무한 경쟁으로 이어진다. 이 때문에 기업들도 자신들의 종종 트랜지스터 집적 수준을 공개하며 기술력을 과시하곤 했다.
일례로 인텔(Intel)은 2017년 10nm 공정 세부 도입 계획을 발표하는 행사에서 자신들은 1㎟당 트랜지스터 1억 800만개를 심을 수 있는 반면, 경쟁사인 삼성전자와 TSMC의 기술은 1㎟당 5000만 개를 심는 수준에 불과하다며 인텔의 기술 우위를 강조한 적도 있다. 물론, 집적도 만으로 전체 반도체 기술 수준을 판가름하는 건 비약이다. 다만 집적도란 단순하고 남에게 보여주기도 쉬운 경쟁적 수치로 생각할 수 있다.
반도체 제조사들의 미세공정, 고집적 경쟁은 제품 소형화 단계를 넘어 이미 만들어진 전자제품의 성능 발전도 빠르게 가속했다. 이를 일상에서 가장 뚜렷하게 체감할 수 있는 게 바로 노트북이나 태블릿, 스마트폰 같은 모바일 기기들이다. 이들 제품은 휴대성 뿐 아니라 속도 역시 데스크톱 PC 못지 않은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것이 목표인데, 이 부분에서 스마트폰 등에 사용되는 모바일 프로세서는 지난 10여년 간 그야말로 눈부신 발전을 거쳐왔다.
2012년 기준 28nm 수준이었던 스마트폰 프로세서의 미세공정 단계는 매년 신제품 발표가 함께 개선되며 현재는 7nm 수준까지 이르러 있다. 이에 프로세서에 집적되는 트랜지스터 숫자 또한 가파르게 증가했는데, 퀄컴과 화웨이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0nm 공정을 적용한 스냅드래곤 835 프로세서에 집적된 트랜지스터 수는 약 30억 개다. 그리고 이듬해 화웨이가 다시 7nm 공정 기린 980 프로세서에 집적한 트랜지스터의 수는 약 69억 개 수준으로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를 보여준다. 참고로 1971년 초기 PC 한 대에 사용된 트랜지스터의 수는 약 2300개에 불과했다.
물리적 한계를 돌파할 차세대 트랜지스터
하지만 문제가 있다. 현재 사용되는 트랜지스터는 이제 개선할 수 있는 집적도가 물리적인 한계에 거의 다다랐다는 점이다. 이런 문제는 업계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돼 온 문제이고, 이를 돌파하기 위한 차세대 트랜지스터 개발에 많은 연구자가 노력을 기울였다. 그리고 현재 가장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는 연구 중 하나가 바로 2009년 KIST의 장준연·구현철 박사팀이 세계 최초로 개발에 성공한 ‘스핀(Spin) 트랜지스터’다.
기존의 트랜지스터는 마치 전구를 껐다 켜듯 회로에 전류를 흘려 전자를 이동시키고, 이 움직임을 0과 1이라는 디지털 정보로 구분한다. 반면, 스핀 트랜지스터는 전자의 이동뿐 아니라 회전(Spin) 정보까지 신호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트랜지스터와 큰 차이를 갖는다.
예를 들어 전자가 오른쪽으로 회전하면 ‘0’, 왼쪽으로 회전하면 ‘1’ 같은 식의 정보처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 이 방식은 기존 트랜지스터와 비교해 전자 이동에 소비되는 전력이 수십분의 일 수준이며, 전기 공급이 끊어져도 데이터가 보존되는 비휘발성을 갖는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전자가 회전하는 스핀 방식의 처리 속도는 기존의 전자 이동 방식보다 속도가 100배 이상 빠르며, 스핀 트랜지스터를 활용하면 메모리와 중앙처리장치를 하나의 칩에 집적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
| [그림7] 스핀트랜지스터 개략도 (사진:한국과학기술연구원) |
물론, 아쉽게도 이 모든 것이 바로 상용화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아직 몇 가지 난제가 남아있는 가운데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문제를 하나씩 풀어가는 중이다. 그중에서도 2017년 실제 반도체 위에서 동작하기 위한 논리회로 구현에 성공한 점과, 이후 영하 200도 이하에서만 작동하던 치명적인 단점을 극복하고 이젠 상온에서도 작동하는 트랜지스터의 형태를 갖췄다는 사실이 고무적인 소식이다.
만약 스핀 트랜지스터가 상용화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전자산업은 아마 또 한 번의 전환기를 맞게될 것이다. 아직 스핀 트랜지스터에 대한 구체적인 포트폴리오는 부족하지만 1회 충전에 수 주에서 한 달까지 작동하는 스마트폰, 부팅 없이 파워를 누르자마자 켜지는 컴퓨터, 고성능 AI 기기, 전력 소모가 대폭 줄어든 슈퍼 컴퓨터, 양자 컴퓨팅 응용, 이로 인한 생산성 향상 등은 지금도 충분히 상상 가능한 범주에 있다.
그와 함께 전자공학의 오랜 역사와 함께해온 가설 - 반도체 칩의 성능은 18개월마다 2배씩 증가한다는 ‘무어의 법칙’이 부활하는 것도 결코 꿈이 아닐 수 있다.
아마 다가올 미래에도 전자산업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는 순간엔 그 밑바탕에 트랜지스터의 진화가 함께하고 있으리라 생각된다. 마치 바퀴나 전구처럼 기술 발전이 선물하는 문명의 혜택을 묵묵히 뒷받침하는 존재. 비록 이제는 눈에는 보이지 않을 만큼 작아졌지만, 누군가의 말처럼 트랜지스터야말로 전자공학이 피운 가장 아름다운 꽃이라 불러도 좋지 않을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