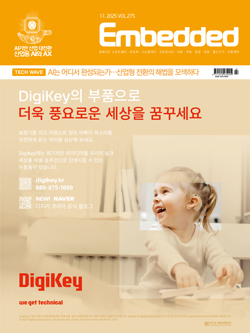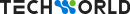[테크월드뉴스=양승갑 기자] 최근 정부와 기업이 앞다퉈 강조하는 키워드가 있다. 바로 ‘소버린 인공지능(AI)’이다. 글로벌 빅테크 모델에 의존하지 않고 국내 기술로 세계적 수준의 모델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흔히 말하는 ‘한국형 AI’가 그 출발점으로 자리 잡고 있다.
소버린 AI의 필요성은 분명하다. 오늘날 AI 경쟁은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 국가 역량과 산업 주도권이 걸린 패권 싸움으로 변모했다. 이에 특정 국가나 기업의 기술력에 종속될 경우 데이터 주권은 물론, 서비스와 산업 생태계 전반이 위험에 놓일 수 있다. 미국, 유럽연합(EU), 중국이 앞다퉈 자국 모델 육성에 나서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문제는 이에 대한 한국의 접근 방식이다. 일각에서는 여전히 ‘한국형’이라는 간판을 내세우는 데 치중하다 보니 정작 글로벌 무대에서 통할 가능성이 희미하다. 한국어 데이터는 영어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고 학습에 필요한 그래픽처리장치(GPU) 자원도 한정적이다. 여기에 연구 인력 부족 등 문제도 겹쳐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소버린 AI의 목표를 단순히 ‘한국형 모델 완성’으로 좁혀선 안 된다고 지적한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정부가 국가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각도의 정책을 내놓는 점은 긍정적이다.
이날 정부는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AI를 핵심 축으로 제시하며 조속한 성과 창출을 약속했다. 최근에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할 정예팀을 꾸려 국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AI를 확보하기 위한 소버린 AI 구축에 나서기도 했다.
소버린 AI가 ‘한국형’이라는 간판에 머물지 않으려면 전 세계를 상대로 검증대에 올라야 한다. 우리 기술로 만든 AI가 세계 무대에서도 인정받는 AI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