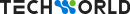[테크월드=방제일 기자] 특허 의견서는 사람이 쓰고 사람이 읽는다. 사람이 관여한다. 변리사는 단어를 선택하고 문장구조를 고민한다. 그러나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출원인의 이름으로 글을 제출해야 하는 입장이다. 이 실무에서 특히 중요한 사람은 발명자와 심사관이다. 특허법에서 이들은 사람으로 존재하지 않고 ‘기관’으로서 존재한다. 그러나 실제 세계에서는 기관이 아닌 ‘사람’으로 존재한다.
법제와 실제의 차이가 의견서 실무를 규정한다. 이 기관들은 특허법이 규율하는 법리 세계에서는 규정과 판례의 지배를 받는다. 반면 실제 세계에서는 심리와 시장의 지배를 받는다. 이 두 가지 성격이 다른 지배가 서로 기묘하게 결합됨으로써 특허현실이 만들어진다.
변리사는 특허법상의 규정과 판례를 잘 안다고 해서 특허 의견서 실무가 높은 수준으로 행해지는 것은 아니다. 반쪽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특허 의견서 실무상의 심리 요소와 시장 요소는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시장 요소는 나중에 언급하더라도 먼저 심리 요소에 대해서 살펴본다. 실무자는 출원인에 속한 사람들, 즉 고객과 부정적인 심사결과를 발급한 심사관의 심리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특허심사는 사람이 한다. 특허청 심사관은 발명의 독창성 인정 여부를 놓고 고심하지만,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면서 출원발명을 심사하지는 않는다. 심사관도 컨베이어 벨트처럼 끊임없이 배당되는 사건을 처리해야 합니다. 1건의 특허출원에 대해서 할당된 시간은 얼마 되지 않는다. 때때로 몇 시간 만에 심사결과를 내야 할지도 모른다. 단순한 구성처럼 보이면 심사관의 인상이 나빠지고, 진보성을 부인하는 판단을 한다. 변리사가 제출은 특허 의견서가 자기도 뻔히 아는 혹은 심사관으로서도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반론을 반복하는 것에 그친다면 거절이유는 더 강해진다.
그렇다면 실무자는 어떻게 이러한 심사관의 심리상태를 고려하여 특허 의견서를 작성할 것인가? 이것이 변리사에게 놓인 과제다. 단순히 사탕발림하는 의견서를 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높여 주면 겸손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오만해지는 사람도 있는 법이다. 포복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때때로 과감하고 적극적인 언어전술을 사용할 수도 있다. 대응하기 어렵다면 심리적인 국면으로 안건을 분석하기 보다는 가장 알맞은 청구항 보정안을 모색한다.
변리사의 역할은 의뢰인이 말하고 싶은 것을 대신 표현하는 것이다. 대리인은 단순한 전달자가 아니라 이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이 의뢰인의 역량을 초월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의뢰인이 말하고 싶은 범위에 그쳐서는 안된다. 더욱 잘 표현해야 한다. 내가 작성한 문서를 읽고 의뢰인이 만족하겠는가, 이것이 일차적으로 문제다. 그러려면 의뢰인이 의견서를 읽고 우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의뢰인은 자기 사건의 당사자이므로 실무자가 작성한 특허 의견서를 이해하고 싶을 것이다. ‘어차피 의뢰인은 무슨 말인지 모를거야’라고 함부로 단정해서는 안된다. 이해가 없다면 칭찬도 없다.
이처럼 본질적으로는 의뢰인의 발명을 지키면서 한편으로는 심사관을 설득해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상황에서조차 고객의 신뢰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특허 의견서 실무의 성격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특허 의견서 실무는 고되지만, 변리사의 역랑을 직접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수단이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